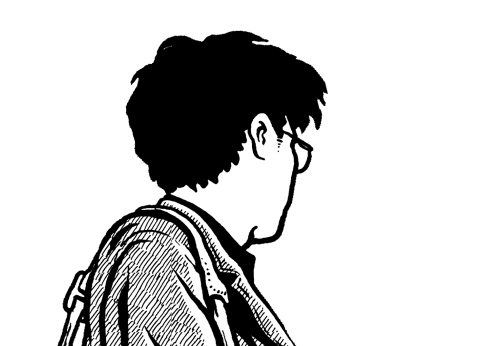세월, 시간, 무섭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예전같지 않다.
문화 분야에 종사하면서 이렇게 지방에 사는 것은 여러 단점이 있다. 신속한 소통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오늘 오후에 회의가 있으니 좀 들러주세요.’라고 하면 ‘4시까지요? 네, 알겠습니다.’라며 평균시속 140km로 서울이나 파주까지 날아가곤 한다. (부담 갖지 마시고 불러주셔요. 어디든지 ‘날아’갑니다.)
지방에 사는 ‘직업적 외로움’은 이런 생활 20년이라 익숙한 편이다. 너무 소통이 없을 때는 대화 방법이나 온도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곧 적응한다. 나를 처음 만나면 나의 눈알이 뱅글뱅글 돌면서 두리번거릴 것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과 자동차와 이렇게 높은 건물들을 오랜만에 봐서 그렇다. 좀만 놔두면 가라앉는다.
지방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쪽저쪽 어른들 걱정도 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있으면 지금 달려갈 수 있을 거리 정도에서 살자는 그저 즉물적인 생각이었다. 친가든 처갓집이든. 어쩌겠나? 국가도 어른들 좀 보살펴주었으면 싶지만, 사람들이 발버둥을 쳐도 꿈쩍을 안 하는데.
얼마 전에, 이번에 이사 온 집을 구경하신 아버지와 어머니는 조금 오래된 집이라도 기뻐하셨다. ‘자주, 맨날 놀러 오시소.’했더니, 과격하고 아무도 안 좋아하는 농담을 즐기는 아버지는 역시나 ‘우째 아노? 이번이 마지막일지.’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엄마와 여동생들이 빽 소리를 지르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모두가 집 둘러보다가 타이밍을 놓쳤다. 한 1.5초 정적이 흐르고, 나는 깜짝 놀라서 ‘뭔 소린교? 40년 더 남았구마! 나중에 증손자들 봐주러 맨날 오소.’ 아버지도 ‘빽’소리가 금세 안 나오니 잠깐 머쓱했다. 저 뒤 베란다에 가서 담배 한 대 무셨다.
처음 서울에 갔을 때, 생업이 있어야겠다 싶어서 웹디자인도 배웠었다. 포트폴리오로 보험맨 하는 친구의 홈페이지도 멋들어지게 만들어주었다(그의 종신보험을 구매할 돈이 없었으므로 대신).
팍팍한 타지생활 1년여를 보내곤 IT회사에 면접을 보았는데, 나보다 몇 살 많아 보이지 않는 녀석이 ‘아버지’에 관해서 말해보라는 것이다. 이 시발노무 새끼가 면접에서 뭐 그런 걸 물어보나 싶었지만, 일단 붙고 보자. 뭐, 이렇게 말했던 것 같다.
'다정스러운 아버지는 아니었다. 다른 애들 가진 것을 못 가진 적이 많았다. 자전거도 스카이 콩콩도, 보물섬 만화책과 변신 로봇도. 극장개봉 우뢰매도 나만 못 봤다. 그런데 불만이 많지는 않았다. 나와 동생들은 그 대신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라고 말하다가 다 큰 놈이 ‘등신’같이 면접장에서 눈물을 왈칵 쏟고 말았다. 질문이 아버지였기에 망정이지, 엄마를 물었다면... 아마 그 녀석을 때렸을 것이다.
보험맨의 홈페이지를 만든 나는 떨어졌고,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알록달록한 홈페이지를 만든 산적같이 생긴 놈은 붙었다. 저 뒤편에 라꾸라꾸 침대는 이제 당신 것이오. 그곳에서 일하지 않게 되어 잘 됐다고 생각했다. 시발놈이 아부지 생각나게 하다니...
세월. 시간. 무섭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예전같지 않다. 세상의 일들에 내 나름의 생각과 느낌들을 말해보지만 모르겠다.
부모는... 아직도 모르겠다. 두렵다. 그래서 모든 아들님들과 딸님들이 존경스럽다. 난 아직 어찌할 줄 모르는 애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