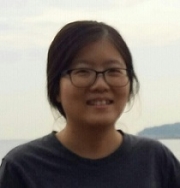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해야 한다면, 당신은 어떤 말을 고르겠는가. ‘정보, 네트워크, 디지털, 글로벌, 혁신, 경쟁’과 같은 유행어들이 반짝반짝하고 의기양양한 얼굴로 선택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내 순서가 돌아오면 나는 그것들을 지나치고 지나쳐, 너처럼 보잘것없고 악취가 나는 말은 후보에 들 자격도 없다는 듯, 저만치 구석에 나동그라진 '쓰레기'를 주저 없이 집어들 것이다. 쓰레기가 '우리 시대의 시'일지도 모른다고 했던 미국의 시인 애먼즈가 그랬듯이.
요란한 수식어 더미들 속에서 기어이 가장 더러운 단어를 품고 온 나는 가만히 앉아 방 안을 둘러본다. ‘취하고, 만들고, 버린다’(take, make, dispose)는 산업사회의 교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음을, 구석구석 숨죽인 계란 껍데기와 플라스틱 박스와 신문지 더미가 증언해준다. 쓰레기장으로 갈 후보를 가려내기 위해 물건들의 쓸모를 손익계산서로 헤아려보던 합리적 정신은 이내 난관에 부딪친다. 다시 보지 않을 것 같지만 버리기는 뭣한 인쇄물과 책들, 몇 년째 묵혀둔 옷가지들은 쓰레기일까, 아닐까. 분리수거를 하고, 재활용을 하면, 쓰레기는 다시 상품이 되고, 그것은 다시 쓰레기가 되겠지. 작년에 산 냉장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마치 쌍생아처럼 쓰레기가 함께 만들어졌을 것이고, 저 냉장고도, 이 집조차도 언젠가는 쓰레기가 되고 말 것이다. 물론 액체, 기체 쓰레기 이야기는 아직 꺼내지도 않았다.
쓰레기는 죽지 않는다. 그것은 영원히 환생하고 회귀한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보낸 쓰레기도 되돌아와야만 했다. 다만 스스로 만든 쓰레기를 지우고 망각해 온 고상한 이들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은유도 우회도 없이, 적나라하고 노골적으로 돌아왔기에 충격을 주었을 뿐이다.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불법폐기물’을 ‘관리’하겠다는 기만적 용어와 부산한 대책 마련의 제스처는 마음 편히 망각의 루트로 돌아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다. 하지만 이런 세상에 태어난 것들은 시차가 있을 뿐, 결국은 모두 쓰레기로 전락할 운명이라는 저주를 떨쳐버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쓰레기들의 심판관은 마침내 거울 속의 나와 눈이 마주친다. 쓰레기를 자신의 ‘외부’에 두던 인간과 쓰레기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이다.
노동력도, 상품도, 화폐도 과잉 공급되는 시대에 쓰레기와 잉여인간의 탄생은 필연적 귀결이다. ‘내가 먹는 것이 곧 나’, ‘내가 사는 곳이 곧 나’라는 명제들에 비추어보아도 쓰레기의 범주에서 인간을 제외하기는 어렵다. 전 지구적 개발은 온 지구의 쓰레기장화(化)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무한한 우주 쓰레기장에 대한 믿음 때문인지, 여전히 과잉 문제에 대한 해답을 더 많은 생산과 소비, 더 많은 인구에서 찾는 악순환의 논리가 지배적이지만, 미국의 최연소 여성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지난 주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라이브 방송에서 기후변화를 포함하여 악화되는 삶의 조건들이 젊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여전히 아이를 갖는 것은 괜찮은 것인가?’라는 ‘정당한’ 질문을 하도록 만든다고 했고, 인도의 청년 라파엘 사무엘은 지난 7일 동의 없이 자신을 낳은 부모를 상대로 고소계획을 밝혔다.
두 사람을 이어주는 것은 인간으로 인해 지구가 걷잡을 수 없이 망가져 가고 있다는 통찰이다. 이제 쓸모를 기준으로 쓰레기를 분류하던 오만한 재판관의 결론은 전혀 다른 곳에 다다른다. 쓰레기는 모두 본래의 ‘집’을 잃어버린 채 존재하는 것들이라고. 겨울 강을 수놓았던 철새들은 이제 쉬지 않고 수만 킬로미터를 날아 제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집을 잃은 새들은 쓰레기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한다. 곰도, 늑대도, 개구리도, 거북이도, 존엄한 죽음의 행렬은 끝없이 이어진다.
쓰레기는 작고 집이 컸을 땐 쓰레기를 처리할 곳도, 새로운 쓰레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도 많은 것으로 여겨졌다. 이제는 집이 모두 망가져 쓰레기로 변한 동시에 쓰레기를 떠맡길 ‘빈 공간’도 더는 남지 않았다. 더 이상 ‘선진국’들의 쓰레기통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베트남은 23조원치의 미국 비행기를 샀고, 하노이에서는 새 도로를 깔고 새 건물을 세울, 새로운 쓰레기장에 대한 기대를 안고 북미회담이 진행되었다. 합의는 무산되었지만 탐욕은 계속될 것이다. 개발과 관광을 향한 지독한 열망을 마주하고 있으면, 뱃사람들이 심청이를 데려갈 때의 심학규와 같은 심정이 되고 만다. “돈도 싫고 쌀도 싫고, 눈뜨기도 내사 싫다”던 그의 심정이. 합계출산율 0.98이라는 숫자가 숨통이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은 귀소본능의 미약한 신호를 전해준다. 눈뜨기도 내사 싫은, 밤이 깊어간다.
글_ 김혜나 hnkim@daegu.ac.kr
관련기사
- [칼럼] 관계없는 것들의 관계
- 경산환경지회 파업 38일 차... “환경 오염 방치하는 경산시 규탄” 기자회견
- 불법쓰레기시민감시단, 경산 생활폐기물 매립장 현장 조사
- 2일 개강 대학가 쓰레기 몸살…“환경미화 노조 파업 장기화, 경산시가 나서야”
- [칼럼] 나를 아파트로부터 구해 주세요
- [칼럼] 미리 축하드립니다
- [칼럼] 잃어버린 손가락
- [칼럼] 꼭두각시의 물음
- [기고] 플라스틱과 함께 지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 [칼럼] 사랑이라는 저항
- [칼럼] 백신과 살처분
- [칼럼] 너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네가 해방되는 건 싫어
- [칼럼] 올림픽의 몸값
- [칼럼] 우주(宇宙)에 겨눈 총구
- [칼럼] 벚꽃 유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