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생명의 무게는 같고, 똑같이 그 무게를 감당하고 있다는 말은 정작 무게를 나눠지지 못한다. 우리가 먹는 밥을 위해 무게를 더 많이 지는 이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p214)
불어오는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매일 기상청을 확인해 따지지 않는다. 준비 없이 인간을 만나고, 준비 없이 만나는 삶의 고저가 인생이다. 인생이 그렇듯, 나는 책도 그렇게 만난다 싶다. 이번에는 ‘밥’과 ‘노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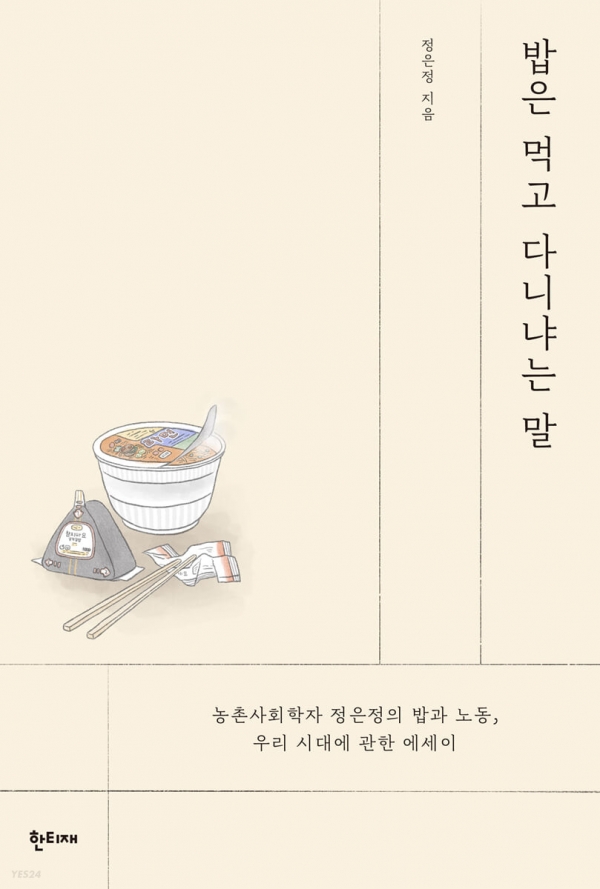
삶이 닳아서 쓰라릴 때 속을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은 밥부터 먹는 것이다. 위로를 해 주고 싶다면 ‘밥은 먹고 다니냐?’라고 물어주면 된다. 표현에 인색한 사람도 ‘밥은 먹었니?’, ‘밥 챙겨 먹어’ 한마디로 정을 녹여낸다. 일할 때 ‘밥 먹고 합시다!’는 10배속의 시너지까지 포함한다.
단군신화는 쑥과 마늘 밥상으로 시작되었고, 예수님은 12인의 제자와 ‘최후의 만찬(밥상)’을 즐겼다고 한다.
정은정 작가는 사회학을 전공하고, 닭을 부전공한 농촌사회학자다. 땅에서 나는 모든 것에 삶을 녹녹히 박아내는 농부의 딸이다. 유통의 혁신과 개혁에 열불을 내지만, 기승전 결말은 인간의 노동에 대한 성찰과 고뇌가 넘친다.
치킨집 사장님 부부는 노부모를 건사하고, 아이들의 학원비를 내며, 당첨된 아파트의 중도금을 열심히 모으는 중일 것이다. 배달 청년은 다음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풍부하게 상상해 본다면, 오늘 시켜 먹는 치킨 한 마리에는 한 사람의 어마어마한 인생도 포개져 달려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p67)
이 책은 인문학을 가장한 오지랖 넓은 농촌 보고서이자 불확실성의 시대에 밥과 노동으로 살아남은 자들의 일기다. 농촌사회학(개설된다면) 한 학기 강의 교재로 거뜬하다. 파란 주식장에서 장타에 상승 비전을 보여주는 주식 하나를 얻은 것 같다고 할까.
작가는 ‘밥’이 ‘자본’을 만나면 괴물이 되는 행태를 고발한다. ‘누가 요새 햄버거로 돈을 버느냐, 잘 될 때 권리금 받고 넘겨야지’ 프랜차이즈 창업설명회에서 들은 말이다. 프랜차이즈에 낙인 된 갑과 을의 불공정만 팩트체크하지 말고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의 밥상에 온기를 보태고 위로를 건네야 한다.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얻어 명예와 부를 얻었을 뿐이라며 겸손해하는 배우가 있다. 겸손이 진실이라면 스태프들 밥상에 숟가락만 얹지 마시라. 열악한 드라마 현장 노동을 고발하고 세상을 떠난 ‘이한빛’군의 빛을 기억하시라.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
기프티콘으로 결제를 하면 가맹점이 내야 할 수수료가 심한 곳은 10%가 넘는다고 한다. 신용카드 수수료 1.6%보다 높지만 가맹점은 거절할 수 없다. 모바일로 기프티콘을 쏘며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려다 타인의 밥상을 서럽게 하게 되었다.
2000년대 초 블루베리 열풍으로 재배지가 늘었다. 그러나 지금은 값싼 미국산 블루베리가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 2010년에는 아로니아가 대세였다. 아로니아는 떫고 신맛이나 2차 가공을 해야 하는 작물이었으니 가치를 올리는 건 쉽지 않았다고 한다. 게다가 홈쇼핑에 값싼 폴란드산 아로니아가 풀려 버렸다. 농부들은 밭을 갈아엎어야 했다.
‘농자지천하대본’ 같은 말들은 이명처럼 귀에서 뭉개지곤 했다. 내게는 그저 ‘농자천한자’로 들렸다. 시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귀한 일은 비싼 급료를 받는 일이고, 헐값을 받는 일은 천한 일일뿐이다. 농업이 그렇고 배달 일이 그렇다. 귀한 일이었다면 자식에게 물려주려 했을 것이다. (p274)
주문하면 8시간이 되지 않아 먹거리가 배달되는 시스템은 맞벌이에게 매력적이다. 한파에 핫팩 하나로 버틴 노동자와 여러 날 야간노동으로 과로한 노동자가 사망했다. 내 밥상에 찬 하나 더하겠다고 노동자의 핫팩 한 개를 빼앗은 결과다.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물류센터는 지금도 팽팽 돈다.
컴퓨터 모니터와 스마트폰 액정 위에서 미끄러지듯 오늘도 쇼핑한다. 주문한 물건은 잘 도착하지만, 현관 앞에 택배 박스를 두고 가는 사람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새벽녘 늦게 시킨 물품이 현관 앞에 놓여 있다면 사람이 다녀갔다는 뜻이다. (p95)
가끔 가는 밥집이 있다. 열악한 재래식 주방에 연로한 어르신들이 쪼그리고 앉아 나물을 다듬고, 연탄불에 김을 굽고, 고등어를 구워낸다. 쟁반을 머리에 얹고 배달도 한다. 가성비 좋다는 밥상에는 저린 무릎과 시린 손가락 값과 값싼 노동력이 들어 있겠다 생각하니 불편함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책은 말한다. ‘밥은 먹고 다니냐’라고 제대로 물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세상이라고. 불편함을 넘어 ‘밥상 너머 사람’에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과 휴게시간은 지켜지는지, 묻고 감시하는 입을 가지라고 말한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서럽지 않은 밥상을 위한 작가의 오지랖에 팬이 되려 한다. ‘더 공정하게 분배된, 더 작은 파이를 올린 밥상’을 위해, 나는 김밥을 좀 더 말아 먹어봐야 할 것 같다.
숙제가 자꾸만 쌓여간다.
삶이 지옥인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사 먹는 김밥 한 줄이 하느님이고 천국이다. (P74)

